이규항 전 KBS 아나운서실장(84)이 5월3일 법보신문에 ‘봉은사 추사의 절필 판전은 붓으로 쓰지 않으셨다’ 제하의 기고를 보내왔다. 1961년 KBS에 입사해 35년간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씨름·야구 중계 전문 캐스터로 활약한 이 전 아나운서실장은 퇴직 후 30년간 불교경전과 수행에 몰두해 ‘0의 행복-붓다는 인생을 발견한 콜럼버스’(2010) ‘부처님의 밥맛-이규항의 0의 행복론’(2018) 등을 발간하기도 했다. 편집자주

1969년 가을 프랑스에서 학위를 마치고 지기(知己)인 지섭(池涉)이 귀국했다. 서화에 관심이 많은 지 박사와 나는 귀국 기념으로 뚝섬에서 나룻배를 타고 봉은사의 판전을 보러갔다. 그 당시는 거리가 멀게 느껴져 지방의 문화유산을 답사하러 가는 듯 했다. 나의 주위의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가이드 노릇을 했다. 나의 집 가보 1호인 당호 반진재(反眞齋)의 유래가 된 판전을 보여주기 위한 나들이였다. 이 무렵에는 판전이 추사의 절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나는 인사동의 명(名) 서각장(書刻匠) 오옥진 선생(훗날 광화문 서각)의 소품 판전(板殿)을 장만 50여년 동안 안방에 모셔놓고 있다.
어느해 정초 대학의 은사이신 운정 김춘동(1906~1982) 선생님 댁에 세배를 드리러 갔다. 선생님은 순국하셨던 조상을 모셨기 때문에 신학문은 접하지 못하셔서 가학(家學)이 학력의 전부였다. 선생께서는 일찍이 위당 정인보, 육당 최남선 선생과 함께 역사서와 문학서를 번역하기도 하였다. 고려대 초대총장이자 우리나라 1호 박사인 현상윤 총장의 스카우트(?)로 고려대에서 평생을 보내셨다. 20세기 신학문에 오염(?)되지 않으셨던 선생님은 어휘와 말씨가 현대인과 많이 달랐다. 한문시간은 마치 조선시대의 선비를 만나 뵙는 듯하여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리고 추사 이래 최고 명필의 양대 거두인 일중 김충현과 여초 김응현의 숙부이셨다. 나의 세배를 받으신 후 마땅히 돌아오는 정월에 마시는 차라고 하시면서 당귀차를 내놓으셨다. 그리고 덕담으로 말문을 여시는 분위기가 천기누설과 보물창고에서 극품을 보여주시는 듯 신중하셨다.
“놀라지 말게. 봉은사의 판전은 붓이 아닌 밥상을 덮는 상보(床褓)로 쓰셨네. 추사가 어린시절로 돌아간 심경에서 쓰셨다 하여 반진체(反眞体)라고 하네. 여기서 반(反)은 돌아갈 반(返), 진(眞)은 아이 동(童)과 같은 뜻일세. 그런데 이 말이 어려운지 요새 사람들은 동자체(童子体)라고 쓰고 있더군.”
나는 마치 불가에서 ‘한 소식’한다는 경지를 짐작하는 듯하였다.
“작고하시기 3일 전 글씨 같지 않게 필력이 있는 것은 붓이 아니라는 반증일세. 봉은사에서 말년을 보내셨던 기력이 쇠잔하신 추사께 주지스님은 어떻게 하면 글씨를 쓰실 수 있게 할까의 중지(衆智)를 모은 결과 필력을 기대할 수 있는 상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추론해 보게 되네. 궁하면 통하는 법이예요.”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자 1960년 4학년 때의 일이 떠올랐다. 3·15부정선거에 항거하기 위해 대학교수단(서울대 조윤제 박사, 고려대 김경탁 교수, 이항녕 교수) 시위 플래카드 글씨를 갑자기 쓰게 되었다. 이때 국문과 동기인 이중흡(동아일보 기자)군이 학교 앞 문방구에서 먹물을 사온 후 기지를 발휘하여 두껍고 단단하며 포장지에 쓰이는 보드지(판지)를 둘둘 말아서 붓 대신 썼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마무리 말씀을 하시려는 듯했다.
“그리고 추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 서예가예요. 그 이전은 선비들의 달필이었지. 조선시대 명필 한호(호 석봉)는 문서를 정서(正書)하는 오늘날 사무관급의 사자관(寫字官)으로 개성 있는 글씨를 쓰지 못하고 천자문 같은 글씨를 썼던 주문예술가였던 셈일세.”
나는 아호로 쓰고 싶은 욕심이 생겨 말씀을 드렸더니 반진재(反眞齋)라고 내려주시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기력이 달리셔서 작은 글씨밖에 못쓰니 조카 되시는 여초 김응현에게 가서 당신의 명(命)이라고 전하라고 하시었다.
여초 선생은 동방연서회에서 나에게 운필법을 가르쳐주신 은사이기도 하였다. 휘호받기 어렵기로 소문난 여초선생께 나는 쉽게 반진재라는 당호를 모시게 되었다. ‘오 숙부 운정선생지명야(吾 叔父 云丁先生之命也)’라는 방제(傍題)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짓곤 한다. 안방에 모신 반진재의 당호를 집에 오신 손님들이 볼 때마다 이 집주인은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농담을 한다. 이후 당호에 걸맞은 아호를 지어 보았다. 처음에는 ‘새잎 돋아날 눈(嫩)’에 ‘풀 초(草)’, 눈초(嫩草)라고 지어보았다. 눈(嫩)의 속자인 ‘눈’(生部 7획)자<그림1>는 봄날 마른 나뭇가지에 새잎이 처음(初) 생기다(生)라는 뜻의 ‘눈이 트다’의 ‘눈’이다.

나는 눈초(嫩草)의 동음이의어인 ‘눈<그림1>初’의 파자(破子)인 ‘初(초·처음처럼)+生(생·산다)’ ‘初(처음처럼)’ 거꾸로 읽어도 오묘하게 같은 뜻이 되어 ‘눈<그림1>初’라고 고쳤고 오래전부터 지인들은 나의 직함 대신 불러주고 있다. 여초 선생에 대한 일화는 많다. 이런 내용도 있다. 우선 선생께서는 추사체(Type) 대신 추사서풍(Style)이라고 하셨는데 추사의 서법 정신은 배우되 글씨를 배우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한국서예가 최초로 북경에서 개인전을 앞두고 수개월간 까다로운 신원조회를 할 무렵의 일화이다. 부동산과 동산을 적는 곳을 보시더니 파안대소 하시면서 하시던 말씀, “내가 서 있으면 부동산이요, 움직이면 동산 아닌가.”
이는 서예 대가로서의 자존감을 보이셨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필자가 당시 방송일정으로 서예실에 나올 수 없다고 하자 기상천외의 말씀을 해주셨다. “좋은 글씨를 보면 마음속으로 써보세요.” 이미지 트레이닝은 오늘날 국가대표 운동선수들도 하고 있다.
나는 오늘날에도 동대문과 남대문을 지날 때면 퇴계 선생이 쓰신 후덕한 느낌의 ‘興仁之門(흥인지문)’과 신숙주의 부친 신장이 쓴 미남처럼 잘생긴 ‘崇禮門(숭례문)’을 마음속으로 쓰고 있다. 나에게 중국여행 할 때의 또 한 가지 즐거움은 곳곳의 간판을 마음속으로 쓰는 재미이다. 이러한 덕분에 작은 서예용 두방지에 농필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판전으로 아호문화와 인연이 되어 주위의 지인과 후배들에게 지어준 아호가 100여개는 될 듯하다. 그 가운데 아나운서 몇 사람의 오랜 차모임인 완월회(玩月會) 멤버들의 아호이다. 학촌(鶴村)이세진, 관봉(觀峰)이계진, 효천(曉泉)김상준, 목리(木里)전우벽, 고진(古眞)김상근 박사, 가천대 동천(童泉)이성락 명예총장 등이다. 나라와 가정에도 문화가 있듯이 아호는 개인문화이다
판전의 필획에 대한 첫 느낌은 기필(起筆)과 수필(收筆)에 대한 획이 뭉뚝뭉뚝하다. 먹이 덜 묻은 비백은 상보가 아니면 낼 수 없을 정도로 거칠다. 상보의 재질에는 발이 굵은 삼베(麻布)와 가는 경우는 사포(紗袍·비단), 모시 무명이 있는데 판전의 붓대용의 상보는 삼베일 듯하다. 판전의 목부(木部) 종획(縱劃)의 기필(起筆)은 마치 꽃이 피기 전의 꽃봉오리와 같은 원필(圓筆)로 붓으로는 힘든 획이다. 획의 굵기에 따라 제일 가는 일분필(一分筆)과 중간 굵기의 이분필(二分筆) 제일 굵은 삼분필(三分筆)이 있다. 판전은 이분필과 삼분필이며 전(殿)의 삐침 획(丿) 끝 부분만이 지나치게 날카로운 일분필이다. 이는 서각과정에서 모필로 썼음을 강조하기 위해 원본글씨와 다른 서각장(書刻匠)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
추사체는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중국의 스승인 완원(阮元)은 서예수련의 이상론인 북비남첩론(北碑南帖論)을 저술한 후 중국학계에 발표하기 전에 추사에게 보내주어 보여주었으니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제주도 유배시절 이 저서를 금과옥조로 환골탈태하여 융합 완성시킨 경지가 동북아 서단에 최초로 등장한 해서도 예서도 아닌 비해비예(非楷非隸)의 추사체이다. 추사는 343개의 아호가운데 완원(阮元)선생이 지어주신 완당(阮堂)이란 호를 즐겨 쓰는 연유를 알 수 있다. 추사체는 거목을 축경(縮景)한 분재의 웅장한 멋 그리고 괴석(怪石)의 미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 민족성의 부끄러운 면을 표현한 속담인 “자신이 배가 고픈 일은 참을 수 있으나 남이 잘된 배 아픈 일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다.
추사는 타인들이 헐 뜯는 자신의 글씨에 대한 조롱에 이렇게 반응했다. 不怪示無以爲書耳(괴상하지 않으면 글씨가 될 수 없을 뿐이다).(註/ 耳:뿐) 추사의 글씨는 엄격해 보인다. 그러나 말년의 ‘遊於三昧, 遊天戲海(유어삼매 유천희해)’라는 작품을 통해서 필법의 해탈의 경지에서 즐기면서 썼음을 알 수 있다. “아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라는 논어의 말씀은 인간생명의 유한성 극복을 위한 반작용의 명제로 보고싶다. 서양에서도 철학자 요한 호이징아(John Huizinga)는 어린이가 장난에 몰두하며 노는 본능은 원초적 본능이라 하였다. 장난감 놀이를 하지 않고 자란 어린이는 훗날 성장하면 폭군형 인간이 된다고도 하였다. 추사의 유희삼매(遊戲三昧)와 요한 호이징아의 호모 루덴스(Homo Ludens)는 동위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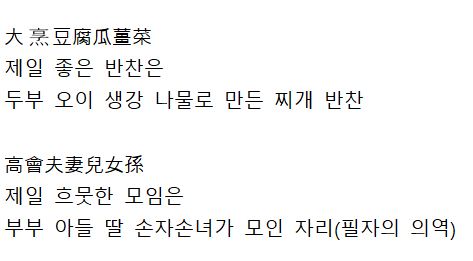

추사는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붕당정치의 희생이 되어 제주도에 이어 함경도 북청에서 유배생활을 했으며 이 무렵 부인과 사별의 아픔을 겪었고 벼슬이라고는 충청도 암행어사를 잠시 했을 뿐이었다. 작고하시기 1년 전에 쓰신 “글씨의 모양새가 소나무 한가지와 같구나(書藝如孤松一枝)”에서도 적막하고 쓸쓸하기만 했던 추사 자신의 심경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앞의 문장에서 왜 한국의 자전에 없는 ‘팽<그림2>’자를 쓰셨을까. 중국의 국학대사(國學大師) 자전에 ‘팽‘<그림2>’과 ‘팽(烹)’이 같은 글자이지만 중국에서도 ‘팽<그림2>’은 상용되지 않았다. 추사께서 학식을 뽐내고 싶으셨던 것일까. 아니라면 이제 이승에서는 ‘亨通(형통)할 일의 소원도 없고 뒤늦게 불자가 되셨기에 잠재의식에서 내세에서라도 향유(享有)의 시절을 기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추사가 사림(士林)의 붕당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양이 되었으니 유교에 염증(?)을 느꼈을 법하다.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다산 정약용에게 24세의 젊은 승려 초의가 배움을 청하러 찾아왔다. 다산은 유학과 제다법을 가르쳤다. 다산의 장남 정학연은 초의를 추사에게 소개해 주어 인연이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추사는 마음 붙일 곳이 유교에서 불교로 옮겨지면서 佛七儒三의 인생관을 갖게 되었다. 이후 동갑내기였던 두 사람은 평생 지기로 지냈다. 여러 차례 초의로부터 차선물 신세를 보답하기 위해 ‘차를 마시면서 선에 들다(啜茗入禪)’라는 방제(傍題)의 추사의 작품 가운데 가장 큰 글씨인 명선(茗禪)을 보낸다. ‘좋은 차는 좋은 친구 같다(佳茗似佳人)’는 말처럼 사셨을 것이다. 이때의 나이가 제주도 유배 5년 전인 50세였다. 어느 학자의 학설에는 명선(茗禪)이란 아호를 지은 후 보낸 작품이라고 하였다.
이 작품의 방제인 병거사(病居士)는 무슨 뜻일까. 추사가 병환 중에 쓰셨다고 생각하기 쉽다. 병거사는 유마힐(維摩詰)을 가리킨다. 유마거사는 재가불자의 우상이었다. 유마경은 붓다께서 10대 제자들에게 유마의 병문안을 가도록 권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소위 프로(?)의 10대 제자들이 아마추어 불자인 유마에게 한때 훈계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문병을 사양한다. 그러나 무던한 성격의 문수보살만이 붓다의 말씀을 받들어 병문안을 간 자리에서 설법을 듣는 형식의 경전이 유마경이다. 이 내용은 어느 고승에게 들은 유마경 출현의 배경이다. 오늘날 보다 인구가 훨씬 적었던 당시 농경사회에서 백성들의 대거 불교의 출가로 농사지을 일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한다. 속세인의 입장에서는 출가가 아닌 가출이었을 것이다. 즉 유마경은 출가 방지용 경전으로 대승불교의 입장에서는 속세에서도 얼마든지 해탈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불국사 석굴암의 협시불하면 완벽한 미(美)의 화신 미스 신라 같은 십일면 관음보살입상과 금강역사가 떠오를 것이다. 미완성 상태의 조각상인 유마거사상은 무시되었다. 그러나 미완의 의도적인 속인상은 재가불자도 진리를 논할 수 있고 깨칠 수 있다는 은유였을 것이다. 유마의 법호인 마힐(摩詰)은 조선과 중국의 불가에서 최고의 인기였다. 중국 문인화의 시조 왕유(王維)하면 서화인들은 단박에 소동파가 그의 시화세계를 극찬한 명구인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가운데는 그림이 있네(畵中有詩 詩中有畵)”가 떠오를 것이다. 이러한 왕유조차도 자신을 왕마힐(王摩詰)이라고 했을 정도였다.

추사는 조선 역사상 최고의 명필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한국의 제1호 고고학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신라의 영토확장 기념사업을 돌에 새긴 조형물인 서울 북한산의 진흥왕 순수비와 함경도의 황초령 순수비의 판독과 현판을 쓰신 학예(學藝)일치의 인물이었다. 추사는 55세부터 9년간 제주도의 유배생활을 마치신 후 63세에서 71세까지 8년간 모두 네 곳에서 지내셨다. 서울의 용산과 함경도 북청(1년) 67세에서 70세까지 과천의 과지초당(瓜地草堂)에서 4년 그리고 작고하시던 해인 71세때 이른 봄 외유내불(外儒內佛)의 불자였던 추사께서 서울의 봉은사로 거처를 옮기셨다. 돌아가시기 3일전에 쓰신 판전의 방제 ‘七十一 果 病中作(칠십일과 병중작)’ 때문에 71세 과천에서 병환중에 쓰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그러할 것 같은데 그러하지 않은 일이 많다(其然不然). ‘七十一 果’는 추사 아호 연구의 대가로 343개를 밝혀낸 최준호 선생의 역저인 ‘추사 명호처럼 살다’에 나온다. 아호의 벽(癖)이 있는 추사는 “上下三千年 縱橫十萬里之室(상하삼천년 종횡십만리지실)”이라는 긴 글자의 호도 있다. ‘七十一 果’는 필자의 견해로는 “말년에 거둔 열매·대표작”이라는 뜻으로 실제로 극소수의 대표작에만 쓰셨다. 추사께서 서울 봉은사에서 약 8개월간 사시다가 돌아가셨던 중요한 행적이다. 71세 때 3월경 봄날 13세의 천재소년 유생(儒生) 명교 상유현(明橋 尙有鉉, 1844~1923)이 어른들을 모시고 당돌하면서도 대견스럽게 봉은사로 추사를 찾아뵌 후 인상을 기록한 책이 추사 방현기(秋史 訪見記)이다. 이때에 ‘봄바람 같은 큰 아량은 만물을 용납하고 가을물 같이 맑은 문장 티끌에 물들지 않네’(春風大雅能容物 秋水文章不染塵).
행서 대련의 이 문장을 보았다는 것으로 보아 봉은사에서 작품활동을 계속 하셨던 것으로 보여진다. 71세의 할아버지와 13세 소년의 대좌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과거 24세의 추사와 78세 옹방강옹과의 첫 만남이 떠오른다. 그리고 추사가 작고하시기 직전의 행적이다. 작고하시기 약 보름전인 9월25일 현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헌인릉을 참배하신다. 헌릉은 3대 태종과 왕후 인릉은 23대 순조와 왕후를 모신 곳이다. 9월 말경 화엄경 판각이 완성되며 10월7일 판전을 쓰셨다. 특히 돌아가시기 하루전 날, 보름 전에 이어서 또다시 인릉을 참배하시고 다음날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정확한 장소는 인릉에서 주무셨는지 봉은사로 돌아오셨는지에 달려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는 없다. (지금까지 자료는 ‘간송문화’ 참조)
이와 같은 극적인 두 번에 걸친 인릉참배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추사가 45세 때 아버지 김노경(1766~1837)은 고금도(古今島)에 유배되어 위리안치(圍籬安置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가둠)되는 뜻밖의 불행을 당한다. 그러나 3년 후 순조의 은총으로 풀려난다. 부자는 얼마나 감격했으며 장래에 대한 기대 또한 얼마나 컸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친의 해배 다음해에 순조께서 갑자기 서거하셨다. 죽음을 예감했던 추사는 순조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유생으로서의 마지막 예를 갖추었던 것이다. 노쇠한 몸을 이끌고 작고하시기 보름전과 하루전날의 비장한 행보에서 인간과 선비 두 면의 추사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추사를 두 번씩이나 귀양 보냈던 붕당 정치판의 패거리 이름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천추의 한을 안고 살았던 추사는 이제 한국 땅을 넘어 동북아시아 서예사에 큰 족적을 남기면서 오래오래 기억하리라. 다시 한 번 지적하거니와 “七十一 果 病中作”으로 과천에서 병환 중에 판전을 쓰셨다는 오늘날의 통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거듭 지적하는 바이다. 참고로 오늘날 봉은사와 과천의 거리는 15km, 헌인릉은 9km이다.
추사체는 제주 유배시절 한을 승화시킨 결정(結晶)으로 파격적인 조형미의 극치이다. 예술가의 평가는 작품에 있다면 추사는 해배 이후 8년 예술인생이었다. 서양미술의 시각에서 추사체는 반추상이다. 동서양 미술은 추상에서 만난다. 서양의 대표적인 화가인 피카소는 “나는 열세살 때 거장처럼 그릴 수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처럼 그리기 위해서는 평생이 걸렸다” “아이처럼은 퇴보가 아닌 성숙된 어른의 천진이다. 사람과 글씨는 함께 늙어간다(人書俱老). 사람은 늙어가면 어린이로 돌아가듯이 동자(童子)가 마음의 고향에서 꽃피운 걸작이 동자체의 판전이다. 大巧若拙(대교약졸) 경지의 판전은 추사 예술의 화룡점정으로 추사의 또다른 백미이다. 끝으로 판전 금칠에 대한 군소리 한마디. 갈대나 억새가 어울릴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코스모스나 양귀비꽃, 장미를 보는 느낌이다.

전 KBS아나운서 실장·KBS 2대 한국어 연구회장
[1680호 / 2023년 5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