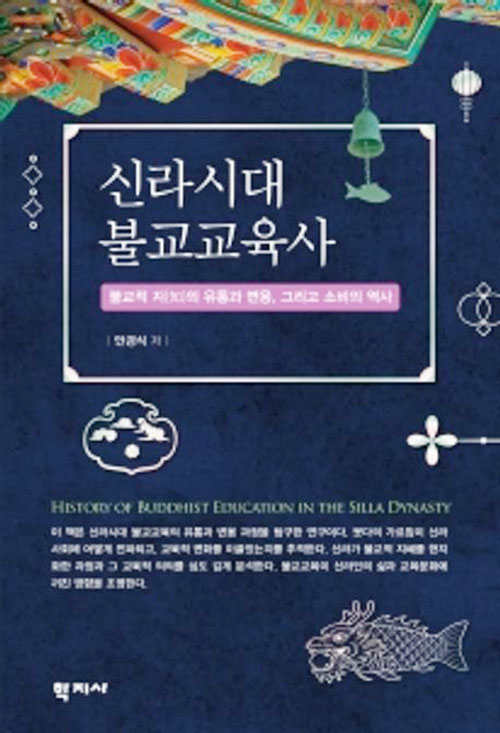
신라 천 년의 역사를 ‘불교적 지식의 유통·변용·소비’라는 시선으로 새롭게 조명한 안경식 부산대 교수의 ‘신라시대 불교교육사’는 기존의 ‘교육사는 곧 학교사’라는 통념을 전면에서 뒤집는다. 저자는 붓다를 인류 최초의 교육자로 보고, 경전의 번역·강설·독송·필사로 이어진 지식의 흐름을 통해 신라 사회의 학문과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전승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저자는 “교육은 지식의 유통과 소비의 과정이며, 불교사 자체가 불교적 지식의 유통사”라고 강조한다. 신라는 불교적 사상을 현지화하는 데 성공한 나라로, 구술 문명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독특한 문명 형태를 가졌다. 하여 저자는 그동안 신라 교육사를 화랑도와 국학 중심으로만 이해해 온 시각을 비판하며 불교적 안목의 부재가 교육사 해석의 왜곡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또 자장, 원효, 의상, 진표 등 신라 고승들의 생애를 교육사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자장은 계율을 중시한 교화로, 의상은 부석사 강설을 통해 화엄사상의 교육화를 이끌었으며, 원효는 민중을 상대로 설법한 ‘저잣거리의 교육자’였다. 그들의 가르침은 단순한 신앙의 전수가 아니라 학습·토론·실천으로 이어진 불교적 학문공동체의 토대였다.
저자는 이에 머물지 않고 아미타·미륵·관음·화엄신앙이 교육 문화에 미친 영향도 추적했다. ‘제망매가’와 ‘도천수관음가’ 같은 문학작품이 신앙교육의 매체로 기능했고, 백좌강회나 법화강경 등 국가적 강경 의례가 대중의 학습장이 되었다. 이러한 의례는 신라인에게 불교를 통한 지적·도덕적 수양의 기회를 제공한 교육의 실천장이었다.
안경식 교수는 “신라는 불교적 지혜를 현지화해 문명의 저수지로 만든 나라”라고 말한다. 붓다의 가르침이 신라에 유입되어 왕실의 후원, 학승의 연구, 민중의 신앙으로 퍼지며 전 사회적 배움의 체계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그는 “불교를 뺀 신라 교육사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맺으며, 교육을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살아 있는 수행으로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불교교육을 단순한 교리 전수가 아닌, 지식의 유통과 실천의 역사로 재해석한 학문적 결실이다. 그리고 그 결실은 신라의 불교는 곧 배움의 문화였고, 그 유산은 오늘날 우리의 교육과 정신문화 속에도 여전히 숨 쉬고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
심정섭 전문위원 sjs88@beopbo.com
[1800호 / 2025년 11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