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 자라 잘 자라 노래를 들으며 / 옥같이 어여쁜 우리 아가야 / 귀여운 너 잠 잘 적에 / 하느적 하느적 나비 춤춘다 / 잘 자라 잘 자라 노래를 들으며”
우리가 잘 아는 슈베르트의 자장가 D.498의 우리말 가사이다. 슈베르트가 1816년, 19세 때 지은 곡으로, 그의 다른 예술가곡(Lied)과 마찬가지로 독일 서정 시인 클라우디우스의 시에 음악을 붙인 작품이다. 모차르트와 브람스의 자장가와 더불어 어린이들도 쉽게 따라부를 수 있고, 교과서에도 실려있어 동요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엿한 예술가곡이다.
슈베르트는 가곡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가 만든 600곡의 가곡은 아름다운 선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전의 작곡가들은 노래의 가사가 잘 전달되는 데 중점을 두고 반주를 붙여 가곡을 썼다. 슈베르트는 이전 시대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가곡 장르에 예술혼을 불어넣었다. 그는 노래 선율을 더 풍부하게 해석하고 리드하는 피아노 반주를 통해 고전적인 균형미와 넘치는 낭만적 서정성을 함께 담았다. 그에게 있어서 자장가 역시 여느 예술가곡과 마찬가지였다.
원래 자장가는 아기를 재우거나 달랠 때 부르는 노래로서 친근하고 소박한 선율로 누구나 쉽게 따라부를 수 있다. 부드러운 음절을 반복하는 노래라고 하여 반복되는 음절과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로 자장가는 이탈리아어로 ‘lullaby’, 스페인어로는 ‘arrullo’라고 부르기도 한다. 독일어로는 ‘Wiegenlied(cradle song)’로 부르는데, 보통 서양에서는 요람을 흔들어 아기를 재우기 때문이다. 클라우디우스의 시에도 ‘어머니가 부드럽게 요람을 흔들어주고, 고요한 평화와 부드러운 위안을 준다’라고 되어 있다.
슈베르트는 ‘가곡의 왕’답게 조용하고 따뜻한 자장가에 간결한 화성 중심의 피아노 반주로 예술성을 더했다. ‘Wiegenlied’라는 이름으로 작곡된 슈베르트의 자장가는 모두 세 곡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자장가 이외에도 슈베르트는 두 개의 자장가(D.304, D.867)를 더 작곡했는데, 그 중 D.867은 상당한 작품성을 보여준다.
‘숲은 손짓하고 시내는 노래하네 / 귀여운 아가야, 이리 오렴 / 아이가 가서 잠시 서있으면 / 그 슬픔은 멀어지네 / 저 편 작은 덤불에서 메추라기 울고 / 빨간 꽃에 햇살 비쳐 이슬 방울 파랗게 빛나네 / 이슬 방울 파랗게 빛나네 / 유리 그릇에 그것을 주어 담으면 / 어머니의 그림자 희미하게 비치고 / 꿈의 신이 그 아이를 잠들게 하네 / 꿈의 신이 그 아이를 잠들게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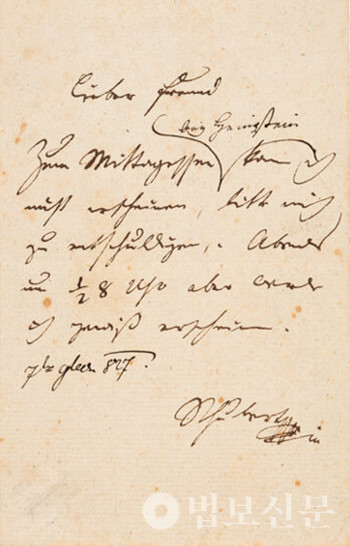
잠든 어린아이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을 노래하며 달콤한 꿈을 꾸기를 바라는 이 작품은 자이들의 시에 노래를 붙였다.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1826년에 작곡된 이 곡은 D.498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D.498이 어머니의 가장 따뜻한 음색으로 듣고 싶은 곡이라면, 이 곡은 초보 아빠가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불러주어야만 할 것 같은 곡이다.
‘마하박가’에는 어린이의 출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한때 아난다 존자를 섬기는 신심 있고 청정한 믿음이 있는 가정이 있었는데, 모두 말라리아로 죽었고, 두 아이만이 살아남았다. 아이들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처럼 수행승들이 보이면 달려갔다. 하지만 수행승들은 그 아이들을 반기지 않았다. 그러자 아이들은 슬프게 울기 시작했다. 아난다는 망설이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열다섯 살이 되지 않은 아이를 출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직 열다섯 살이 되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퇴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난다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아이들은 부모가 없이 계속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 출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물으셨다. “아난다야, 아이들이 까마귀를 날려 보낼 수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기회로 법문을 하고 수행승들에게 말했다. “수행승들이여, 열다섯 살 미만이라도 까마귀를 날려 보낼 수 있는 아이라면 출가시키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겠다.”
원래 열다섯 살 이상이 되어야 출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긴 것은 전염병 때문이었다. 전염병이 돌아 아이들만 살아남았을 때, 가엾은 마음에 아이들을 출가시키고 보니, 종일 아이들을 챙겨야 했던 수행승들은 수행도, 공부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출가를 허락하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율법은 언제나 엄격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열다섯 살 미만은 원칙적으로 출가를 금지했지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는 고아들은 예외적으로 출가를 할 수가 있었다. 부처님은 부모의 그늘이 필요한 의지할 곳이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손길을 내밀었다. 아기를 재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자장가를 부르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었을까.
슈베르트의 ‘요람 속의 아기, D.579(Der Knabe in der Wiege)’라는 가곡은 자장가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유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슈베르트가 자장가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자장가들과 함께 묶여 종종 ‘자장가’로 불리는 곡이다. 오텐발트의 시를 가사로 하고 있는데 앞의 두 곡과는 시선으로 그려지고 있다. 앞의 두 곡이 ‘아가야 잘 자라, 천사 같은 아가야 잠에서 깨지 않게 엄마가 지켜줄게, 좋은 꿈을 꾸렴’ 이런 내용이라면, 이 곡은 ‘요람 속의 아기는 달콤한 꿈을 꾼다. 어머니는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한편의 그림을 묘사한 것과 같다. 평생을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지만, 항상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이상적인 가정을 꿈꾸었던 슈베르트는 이 시를 읽고 아름다운 선율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 열다섯 살이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의 출가를 금했던 것은 단순히 수행승들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너무 어린 나이에 출가한 아이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출가할 수 있는 방편을 열어 보듬어 주셨다. 늦은 가을, 슈베르트의 자장가를 들으며 경전의 일화를 생각해 본다. 부처님 앞에서는 언제나 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리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평안을 주는 노래들이 아닐까.
김준희 피아니스트 pianistjk@naver.com
[1609호 / 2021년 11월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